단색화의 그늘을 넘어, K-아트는 ‘장르’가 될 수 있을까 [김희선의 글로벌 K컬처 이야기⑧]
입력 2025.12.12 14:01
수정 2025.12.12 14:01
가을이 되면 서울은 거대한 갤러리가 됩니다.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가 열리는 코엑스는 전 세계에서 날아온 컬렉터와 미술 관계자들로 북적이며, 한남동과 청담동의 갤러리 나이트에서는 늦은 밤까지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반짝입니다. 이 화려한 풍경만 놓고 보면 지금이야말로 K-아트의 전성기처럼 보이지만, 축제의 조명이 꺼진 뒤 남는 미묘한 공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
해외 VIP들이 주목한다고 하는 한국 미술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려 보면 여전히 단색화(Dansaekhwa)의 거장들이 가장 먼저, 때로는 거의 유일하게 호명됩니다. 박서보, 이우환, 하종현. 그들의 수행적 태도와 정신의 미학은 깊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2025년의 K-아트가 여전히 그 그늘 아래 머무는 현실은 어쩐지 아프게 다가옵니다. 아트페어의 부스를 걷다 보면 이미 본 듯한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거장들의 화풍을 닮은 추상 회화들이 ‘제2의 단색화’를 내세워 걸려 있고, 실험보다는 익숙함이 선택되는 구조도 보입니다. K-팝이 아이돌을 넘어 밴드·힙합·발라드로 장르적 지평을 무한히 확장한 것과 달리, K-아트는 혹시 성공한 방정식 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묻게 됩니다. K-아트는 하나의 견고한 장르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선 시선을 넓혀야 합니다. 한국적 미학이 세계에서 주목받는 지점은 의외로 ‘공예’에 있습니다. 달항아리의 비대칭적 곡선, 옻칠의 깊고 고요한 어둠, 자개의 영롱하게 부서지는 빛. 우리는 이를 전통 공예라 부르며 기념품의 영역 정도로 인식해왔지만, 세계는 이를 오브제 아트(Object Art)와 파인 크래프트(Fine Craft)의 범주로 읽고 있습니다. 서구 현대미술이 미니멀리즘을 거치며 잃어버린 ‘손의 노동’과 ‘시간의 축적’이 한국 공예 안에는 여전히 숨 쉬기 때문입니다. 로에베 재단 공예상에서 한국 작가들이 연이어 수상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의 K-아트가 단색화 이후의 새로운 언어를 찾고 있다면, 그 길 중 하나는 흙과 불, 나무와 금속, 그리고 장인의 손끝에서 태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술은 뛰어난 개인 몇 명만으로는 확장될 수 없습니다. 생태계가 있어야 합니다. K-팝이 세계를 흔든 이유는 훌륭한 가수 한 명 때문이 아니라, 연습생 시스템·콘텐츠 제작·플랫폼·팬덤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미술계는 여전히 폐쇄적입니다. 젊은 작가들은 메이저 갤러리의 선택을 기다리며 작업실에 고립되고, 컬렉터들은 신인 작가의 작품과 세계관에 접근할 경로가 부족합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미술에는 온라인 갤러리를 넘어, ‘미술계의 넷플릭스’에 가까운 플랫폼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문턱은 낮지만 플랫폼 자체가 큐레이터로 기능하는 구조. 장르·세대·재료·배경이 다른 작가들을 공정하게 연결하면서도, 그 안에서 작품의 질과 서사를 선별해 보여주는 곳. 갤러리 문턱을 넘지 않아도 전 세계 컬렉터가 한국 신진 작가의 포트폴리오를 탐색하고, 작품이 품은 시대적 감각을 이해하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는 구조. 작품이라는 물건이 아니라 한국의 젊은 예술가들이 지금 어떤 생각과 재료로 시대를 번역하고 있는지, 그 ‘씬’ 자체를 하나의 문화적 콘텐츠로 유통하는 플랫폼들이 있다면, 담론은 조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국에는 열정과 실력을 갖춘 젊은 창작자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들이 단색화라는 거대한 산을 넘지 못해 좌절하거나 좁은 내수 시장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길을 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특정 스타 작가의 등장을 기다리는 ‘천재 신화’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공예·회화·미디어아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세대와 장르가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투명하고 확장성 있는 유통 구조가 마련되는 건강한 토양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컬렉터들이 지금보다 넓고 깊은 시야로 이 토양을 가꾸는 데 힘을 보태야 할 때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의 K-아트는 노를 젓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방향을 정하고, 더 단단한 돛을 달아야 합니다. K-아트가 반짝하고 사라지는 유행이 아니라 세계 미술사에 기록될 굵직한 한 챕터가 되기를, 그리고 그 과실이 묵묵히 작업실을 지키는 수많은 작가들에게 고르게 닿는 안정된 낙수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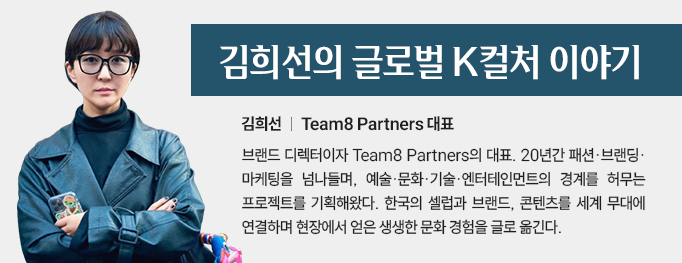 ⓒ
ⓒ
김희선 Team8 Partners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