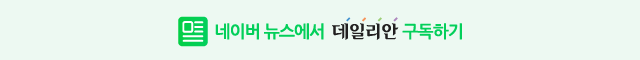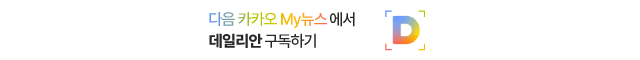문화권력된 신경숙을 지금에서야 단죄한다고?
입력 2015.06.18 10:01
수정 2015.06.18 10:07
<김헌식의 문화 꼬기>삽으로 퍼낼 일을 포클레인으로도 불가능
 소설가 신경숙 씨의 작품이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중 일부 내용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소설가 신경숙 씨의 작품이 일본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중 일부 내용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어떻게 보면 신경숙은 희생양인지 모른다. 그런 점이 단지 신경숙 개인에게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지도 모른다. 문학권력 현상의 와중에 구조적으로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본래 문학은 순수하게 작품성만을 가지고 논해야 할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현실에서는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을 한다.
문학작품은 그것을 출판하는 이들의 상품이다. 사람들이 문학작품을 많이 사는 것은 수익의 창출에 있다. 문학작품은 적어도 그것을 출판을 통해 수익을 채우는 출판사가 있어야 가능하다. 문학계라는 것은 문학 전문 출판사 등을 매개로 구성될 수 밖에 없다. 대형 문학전문출판사들은 문예지들의 작품공모등을 통해 신인을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집을 출판하면서 수익의 순환을 이루려한다. 대형 슈퍼스타가 태어날수록 당연히 더욱 이는 증가한다.
하지만 그러려면 이 과정에서 권위의 브랜드가 필요하다. 문학평론가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학평론가들도 활동 기반이 이런 대형출판사들이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좁은 인맥 범위 안에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하기가 힘들다. 이에 균형잡힌 평론이 아니라 주례사 비평이 쏟아 지게 된다. 함량 미달의 작품이 좋은 작품, 우수한 작품이 되어 해당 작가의 권위성을 만들어준다. 하나의 출판사가 아니라 문학계 전체가 슈퍼스타를 원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이런 행위들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구조속에서 항상 스타는 탄생하게 되는데 자주 젊은 작가들이 루키가 되어 버린다. 이런 새로운 루키들은 한국 문학의 희망이라는 타이틀을 달기 시작한다. 이런 스타의 탄생이 대형문학전문출판사나 문예지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그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하기는 쉽지 않다. 비록 함량 미달의 작품이 있거나 심지어 표절 작품이 있어도 말이다. 이런 암묵적인 기저는 결국 문학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문학전문출판사 출신일 수록 더욱 강하게 적용받는다.
그런데 이른바 슈퍼스타 상품 만들기는 정작 작가들의 표절행위를 조장하게 만든다. 너무 이른 시점에 대형 작가가 되고, 한국문학의 흐름을 맡았기 때문이다. 즉 작품에 대한 압박감을 크게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려면 훌륭한 작품을 써야 한다. 그러나 작가는 현실적 경험과 그에 따른 작가적 역량이 축적되어야 이에 부합한 작품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은 법이다.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른 이들의 작품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설령 그렇게 해도 제대로 걸러내야 하는데 주례사 비평을 양산하는 문화권력 시스템은 이를 눈감아 준다.
신경숙은 1985년 등단 이후 여러차례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지금이야 '엄마를 부탁해'등으로 슈퍼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해외 34개국에서도 작품을 번역 출간한 세계작가이지만, 90년대에는 과중한 부담에 창작의 고통을 느끼던 신인 작가였다. 이번에 표절 논란에 휩싸인 작품 '전설'도 이에 해당한다. 문단의 대형 스타로 떠오르는 와중에 이런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점을 부각하는 이유는 프로작가로는 절대할 수 없는 표절을 해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마저도 부정한다면 심각한 창작에 대한 철학의 부재와 기본 소양에 대한 결핍이 존재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학 권력을 견제할 이들이 없던 현실이 그대로 적용된 사례이다. 신경숙이 문제의 작품을 여러 차례 발표하여 논란을 일으킬 때 평론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들도 문학 권력 시스템에서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논란이나 문제 제기는 있어도 단발마 차원의 소란으로 끝날 뿐이다. 이것이 오래된 습관처럼 굳어졌고 그 사이 신경숙은 내외에서 너무 유명한 작가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표절 논란은 그냥 묻히는 듯 했다.
갑자기 신경숙 표절이 등장한 것은 너무나 유명해졌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래서 신경숙이 세계작가가 된 마당에 애초에 손가락으로도 막을 수 있었던 일이 포클레인으로도 못 막는 일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진작에 조치를 취하고 털어버려야 했던 일이다. 개인의 표절 행위야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노릇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조장하고 방치하는 상품화의 문화권력 시스템은 더 바뀌어야 한다.
그런 시스템에 갇혀 있는 문학은 계속 독자에 맞는 작품에서 멀어질 것이다. 그것이 한국 문학의 위기를 가중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좋은 작품은 그것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설령 표절의 작품이 시도 되어도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자율적 정화기능이 항상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