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낮은 전문성과 불신이 불러온 식약처 패싱 현상
이은정 기자
입력 2020.01.06 07:00 수정 2020.01.07 10:18
입력 2020.01.06 07:00 수정 2020.01.07 10:18
신약 개발은 속도·정확성 중요한데 인력난으로 '하세월'
식약처 회피하고 해외부터 문 두드려
신약 개발은 속도·정확성 중요한데 인력난으로 '하세월'
식약처 회피하고 해외부터 문 두드려
 ⓒ데일리안
ⓒ데일리안
작년 이맘때쯤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만 소외된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라는 말이 뉴스에 오르내렸다. 한국을 빼놓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이 북한 관련 이슈를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말한 것이다.
요즘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를 빗대 ‘식약처 패싱’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신약후보물질의 임상시험 및 허가 등을 위해 국내 업체들이 한국 식약처에 의뢰하지 않고 곧장 미국, 유럽 등 외국으로 향한다는 의미다.
기업들이 신약 개발을 위해 한국보다 외국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 데는 식약처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 업계는 한국 식약처의 수준 낮은 전문성과 인력난에 대해 자조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식약처의 전문성 결여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약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약의 가치는 물론 회사의 미래까지 흔들릴 수 있어 기업들이 식약처를 건너뛰고 있는 것이다.
이미 상당수 기업이 해외에서 먼저 신약허가를 받고 국내에서는 나중에 허가받는 것으로 사업전략을 짜고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먼저 신약허가를 받게 되면 식약처도 이를 참고해 허가가 수월하게 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인지 작년에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국산 신약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과거 매년 1~2개에서 최대 5개까지 국산 신약이 쏟아졌던 것과 대조적이다.
신약 허가를 신청하기 하기 위해 FDA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30억원으로 700만원인 식약처의 400배에 달하지만 FDA를 선호하는 현상은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다. 신약 개발에서 비용보다는 속도와 정확성이 훨씬 중요한 만큼 비싼 비용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도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 식약처는 이런 현상을 인식하고 인·허가 전문인력을 대폭 늘리는 것을 추진 중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 인·허가 전문인력은 2018년 기준 354명에 불과하다. 품목당 심사인력도 식약처가 5명인데 비해 미국은 45명, 일본은 20명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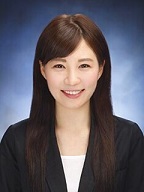 ⓒ데일리안
ⓒ데일리안
식약처는 최근 임상시험, 의약품, 바이오, 의료기기 등 4개 분야에서 심사관 44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이 커지는 속도에 너무 늦지 않게 식약처의 인력과 시스템이 따라오길 바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실시간 랭킹
●
●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